1000조 원 비상경보 울린 가계부채 [한국일보 사설-20130806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3월 961조6,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분기 들어 다시 급증,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데서 보듯 앞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 경보가 울렸으나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갖고 있고,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50% 수준이라 집값이 더 내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가 잠시 주춤하다 빠른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나갈 이자는 늘어나게 됐다. 금리가 오르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연체가 증가하면 '깡통' 주택도 늘어나 가계와 금융권 모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비상경보가 울린 이상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질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계층의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소금융 등을 확대 개편해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립, 저금리 대출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주택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의 정상화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 근본적 해법은 경기를 살려 소득을 개선시키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황 변화에 맞는 정교한 연착륙 대책을 다듬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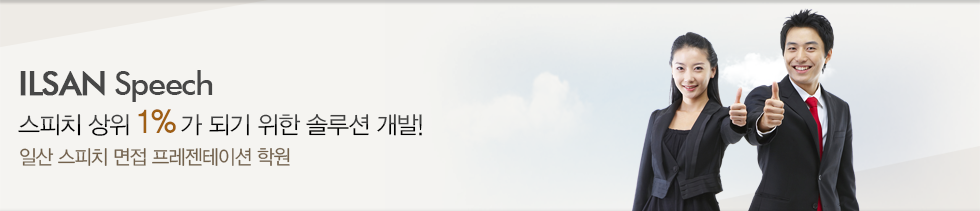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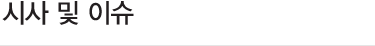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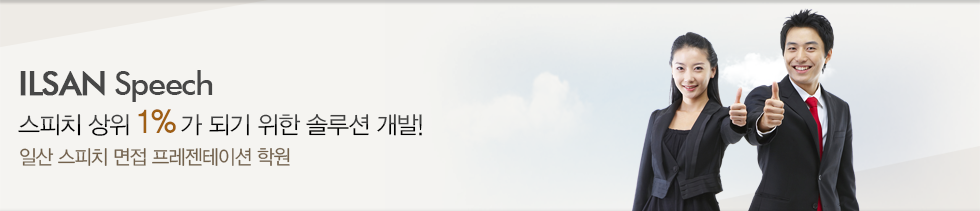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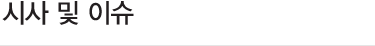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