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순진한 기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30731수] 고용노동부가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3000개로 늘려 1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일자리도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후속 대책이라고 한다. 아마도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을 고용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해결하는 묘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과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 그리고 그 일자리가 과연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사회적 기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육성법까지 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업들의 자발적 수요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저 단어가 아름답고 목적이 선하다는 논리 하나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급조한 것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 수가 10배 이상 늘어났고 고용도 8배 늘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이 저임 서비스업이고 그나마도 기존의 시장형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 용역 등 환경사업(16.5%)이 가장 많고 방과후교실 등 문화사업분야(15.9%), 사회복지(11.9%) 등의 순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적 기업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멀쩡한 청소 용역회사나 문화예술기획사 일자리만 사라지는 판국이다. 결국 전체의 일자리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고용의 질만 악화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재부의 협동조합, 안행부의 마을기업, 농식품부의 농촌공동체회사 등 각 부처들이 이름을 달리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우습다. 고도화된 분업체계에 의해 전문적 기술 수준에서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대 기업사회다. 그런데 고도화된 기업이 아니라 소꿉장난 같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아는 사람끼리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린다니 트랙터를 버리고 호미를 드는 격이며 발전기를 버리고 등잔불을 켜자는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 혁신이 아니고는 절대 늘어날 수 없다.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은 야생의 시장경제를 정부가 일일이 먹이를 줘야 하는 동물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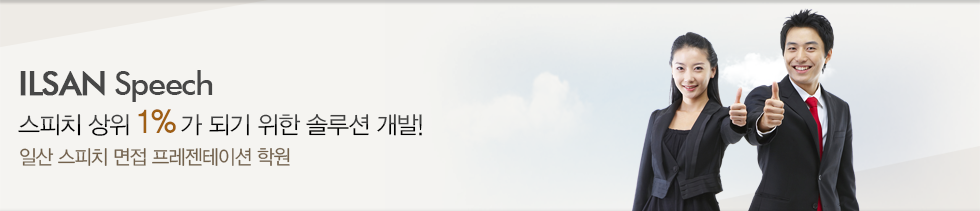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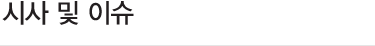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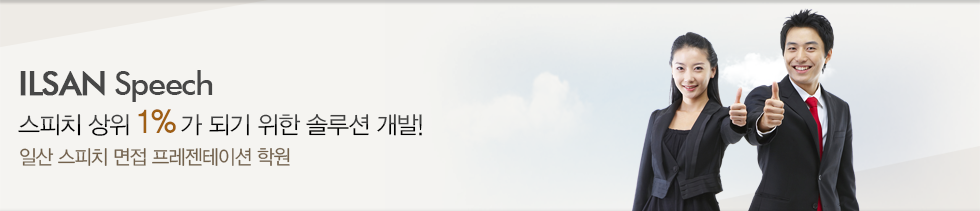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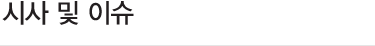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