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벗어날 유인 제공 옳은 방향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30911수] 정부가 어제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보다 탈(脫)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수급자가 일을 더 많이 해 소득을 늘릴 능력이 있어도 혜택이 끊길까 봐 복지 혜택에만 기대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원 대상을 여러 층으로 나눈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대비 40%(4인 가족 기준 월 155만원)로 정하고 소득이 이 수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여러 가지 급여를 모두 끊어버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이다. 이에 비해 새 제도는 생계급여(중위소득 대비 30%)-의료급여(40%)-주거급여(43%)-교육급여(50%) 지원을 차례로 벗어나게 하는 다층 구조다. 상대적 빈곤층을 가르는 경계선인 중위소득의 절반(4인 가족 월 192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복지 개혁의 요체가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라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온실을 벗어나려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일과 보장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다. 제도가 바뀌면 기초보장 수급자는 83만가구 140만명에서 110만가구 180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기초보장 수급자로 남아 있는 24만명은 탈수급 유인이 커지겠지만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40만명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최대한 자활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도 한 해 1조2000억원가량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해 2017년까지 6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공약가계부 추산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 상대적 빈곤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치밀한 제도 보완을 계속하기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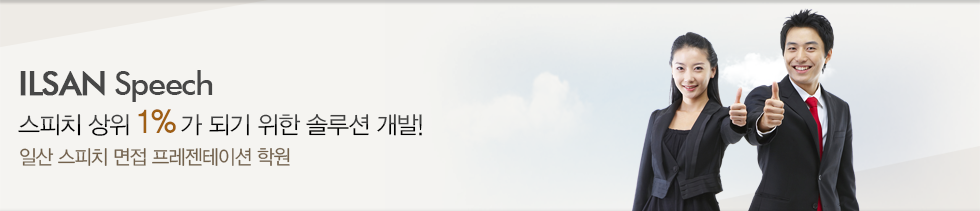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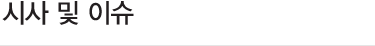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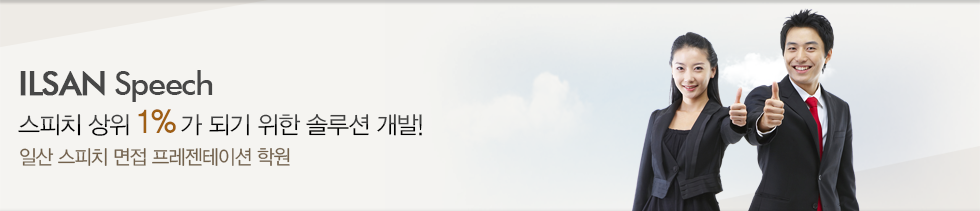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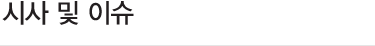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
Home > 본원소개 > 시사 및 이슈